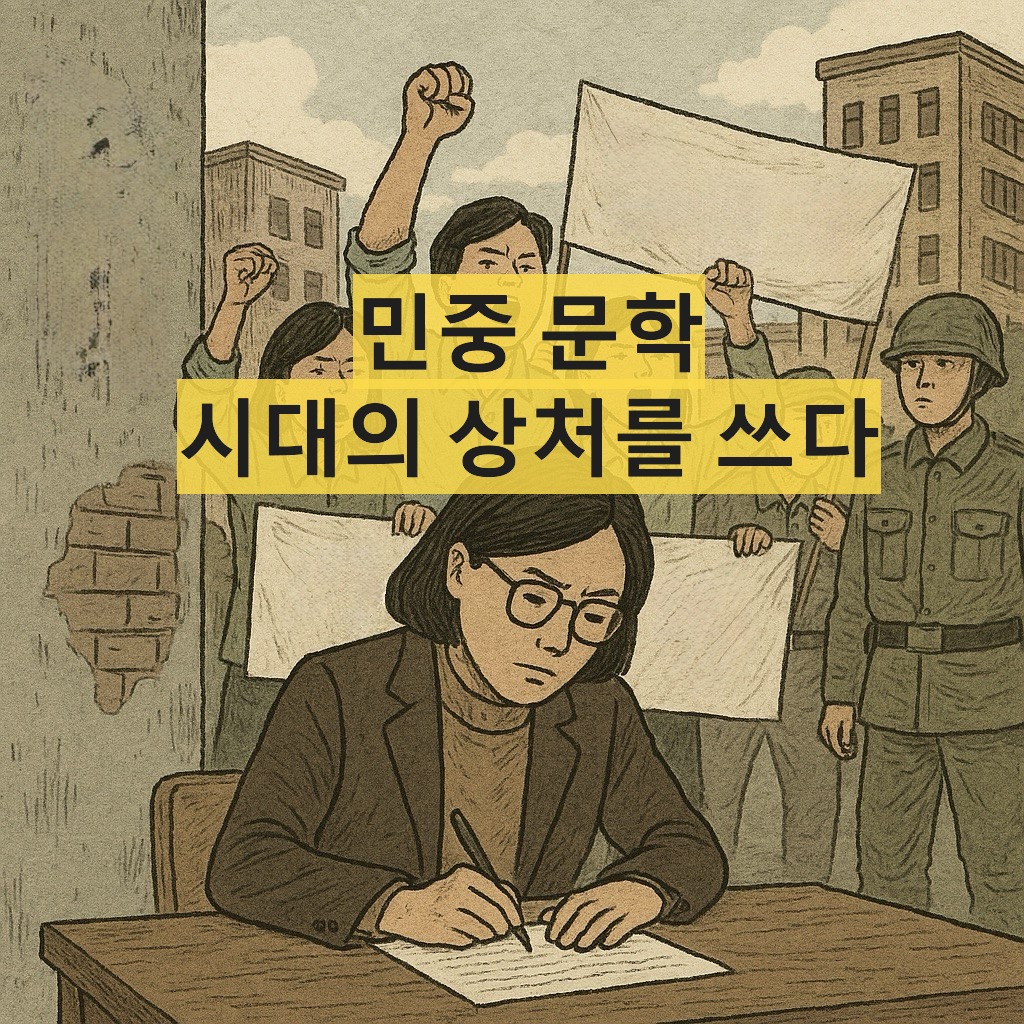
1. 민중 문학
‘민중’이란 말은 백성, 국민처럼 들리지만 조금 더 다르다. 민중은, 쉽게 말해 시대의 고통을 짊어진 사람들을 말한다. 노동자, 농민, 학생들처럼 주류 권력 바깥에 있지만 역사의 중심에 서 있는 이들이다. 민중 문학은 이들의 이야기를 문학으로 옮겨온 흐름이다. 어려운 말로 하면 ‘문학의 주체를 민중으로 바꾸고, 내용도 민중의 현실을 반영한 문학’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개념은 1980년대 사회학자 임헌영과 문학평론가 김윤식 같은 이들이 이론적으로 다듬었다. 그들은 문학이 개인의 감정만을 다루어선 안 되고, 사회의 구조를 돌아보는 책임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민중 문학은 단순한 ‘정치 선전’이 아니라 삶의 구체성을 이야기하는 문학이었다는 점이다.
2. 민주화 운동과 문학
그 시절엔 시위가 일상이었다. 누구나 가슴속에 ‘민주화’라는 단어를 품고 있었고, 술집에서 “이런 세상은 잘못됐어”라고 중얼거리다 끌려간 청년도 있었다. 문학은 이 ‘작고 조용한 폭발들’을 기록했다.
1980년 5월, 광주. 누군가 시장 골목에 버려진 신발을 봤다고 했다. 그 신발 하나에서부터 문학이 시작됐다. 황석영의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는 광주의 진실을 문학으로 옮긴 대표적인 르포 형식의 작품이다. 그는 허공에 대고 울부짖는 목소리를 글로 눌러 담았다. 비명은 글자가 되었고, 그 글자는 살아남아 세대를 건너갔다.
그보다 앞선 시대, 1970년 전태일의 분신은 한국 사회 전체를 흔들었다. 그는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는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그 이후 그의 삶을 바탕으로 한 수많은 시와 소설이 쏟아졌고, 이 사건은 노동 문학의 불씨가 됐다. 시인 박노해는 이러한 노동자들의 삶을 시로 표현한 대표적인 작가다. 그의 시집 『노동의 새벽』은 칠흑 같은 공장 바닥에서 들려오는 “쾅쾅” 소리만큼이나 날카롭고도 절박했다.
3. 문학 속 저항의 풍경
민중 문학은 대체로 거칠다. 의성어도, 욕설도 감추지 않는다. 왜냐면 그건 날 것 그대로의 ‘그들의 언어’였기 때문이다. 벽에 붙은 대자보는 문장이 아니라 외침이었고, 시는 꽃이 아니라 피로 쓴 유서였다. 민중 문학은 늘 ‘현장’에 있었다. 노동자의 기숙사, 해고 통지서가 나뒹구는 사무실, 그리고 경찰서 유치장 안. 그 현장들이 문학의 무대가 되었다.
그 속에서 또 다른 대표 작가로는 조세희가 있다. 그의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은 그 시대 도시 빈민의 삶을 다룬 걸작이다. 난장이 가족의 삶은 어둡고 처참하다.
민중 문학이 특별한 이유는, 그것이 단순히 현실을 반영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행동을 부르는 문학’이었다는 점이다. 읽은 후 마음만 아픈 게 아니라, 거리로 나가게 만드는 글이었다. 그 점에서 1980년대의 민중 문학은 거의 행위예술에 가까웠다. 낭독회는 집회가 되었고, 시인은 투사가 되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 글들이 무거운 이론이 아니라 ‘삶에서 길어낸 말’이었기 때문이다. 마치 무릎을 굽히고 앉아 누군가의 하루를 온전히 들어주는 것처럼, 민중 문학은 민중의 삶에 귀를 기울이는 문학이었다.
4. 시대의 기록자
그 시절엔 문학이 유일한 ‘기록자’였다. 거칠지만 끝내는 따뜻하게 인간을 끌어안던 그 시대의 문학. 그것은 찢긴 일기장 같은 시대 속에서, 누군가 놓치고 지나간 진실을 다시 꿰매던 글쓰기였다. 그 시절의 작가들은 우리가 아닌, ‘우리’를 썼다. 그 차이가 모든 걸 바꾸었다. 민중이 존재하는 한 민중 문학은 영원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