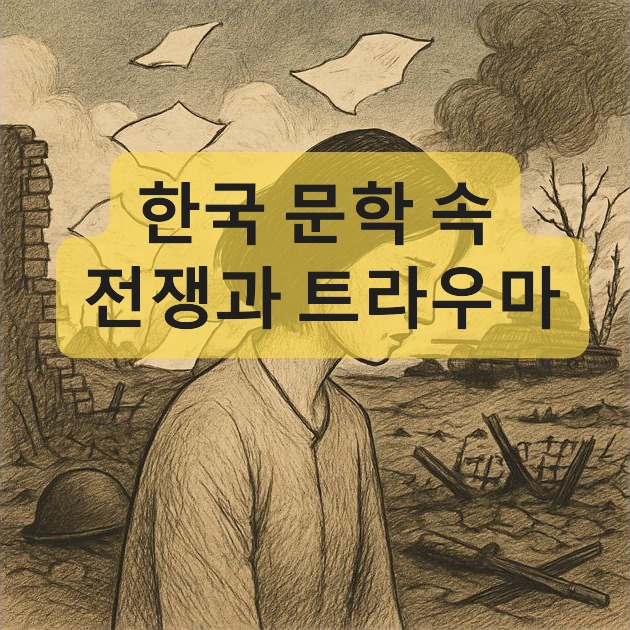
1. 한국 문학의 전쟁과 트라우마 서사
늘 그랬다. 한 사람이 겪은 전쟁은 종이 위로는 번지지 않았다. 누군가는 조용히 국수를 말았고, 또 누군가는 아이를 업었다. 그러나 땅 밑 어딘가, 아직도 굳지 못한 흙처럼, 트라우마는 소리를 삼키며 퍼지고 있었다. 총성과 함께 기억이 뚫렸고, 그 구멍은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끝내 아물지 않는 창문처럼 입을 벌리고 있었다.
기억은 정말 하나의 선으로 엮이는 걸까. 아니면 그것은, 찢어진 신문 조각처럼 흩어진 다음, 거리 곳곳에서 신발에 달라붙는 형태로만 비로소 ‘남게 되는’ 것일까. 전쟁은 국가의 이름으로 시작되지만, 고통은 이름을 가릴 것 없이 아니 이름 없이도 퍼진다. 그러므로 전쟁 문학이란 아직 붙잡지 못한 감정들의 흐름을 기록하려는 시도였을 것이다.
2. 대표작
김원일 작가의『불의 제전』은 1950년 경남의 소읍 진영과 서울, 평양을 배경으로 전쟁 전후에 처한 민중들의 삶을 치열하게 그려냈다. 총을 든 사내들, 사상 검열표에 붙은 이력 등 소설은 전쟁의 참상을 고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쟁이 가족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갉아먹었는가에 대해 말한다.
황석영 작가의『손님』은 한국전쟁 당시 좌우 이념 갈등이 민간인 학살로 이어졌던 황해도 신천의 기억을 되짚는다. 바로 양민학살이다. 서로를 죽고 죽인 이들 모두가 자신을 정당화하고, 인물들은 모두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이다. 귀신을 통해 밝혀지는 그날들의 진실은 참담하기만 하다.
박완서 작가의『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속 전쟁은 그녀의 오빠를 폐인으로 만들었고, 소녀였던 그녀를 어른으로 내몰았다. 그녀는 전쟁을 외치지 않았다. 더욱 몸을 숨기고 독서에 집중했다. 가족 안에서 사상과 이념으로 인해 누군가는 죽고, 누군가는 살아남기도 했다. 그런 지옥 속에서 때마다 변모하는 사람의 모습을 생생히 기록했다.
3. 마치며
전쟁 문학이 전투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총성이 사라진 뒤에도 계속 이어지는 웅성거림을 기록하는 것이라면, 그 소설들은 말이 아닌 침묵의 방식으로 이야기한다. 전쟁은 공식 기록보다 비공식 기억에 그러니까 문학에 더 오래 머문다. 이제, 우리는 묻는다. 말하지 않은 것들은 진정 사라졌는가. 아니면, 아직 문장이 되지 못했을 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