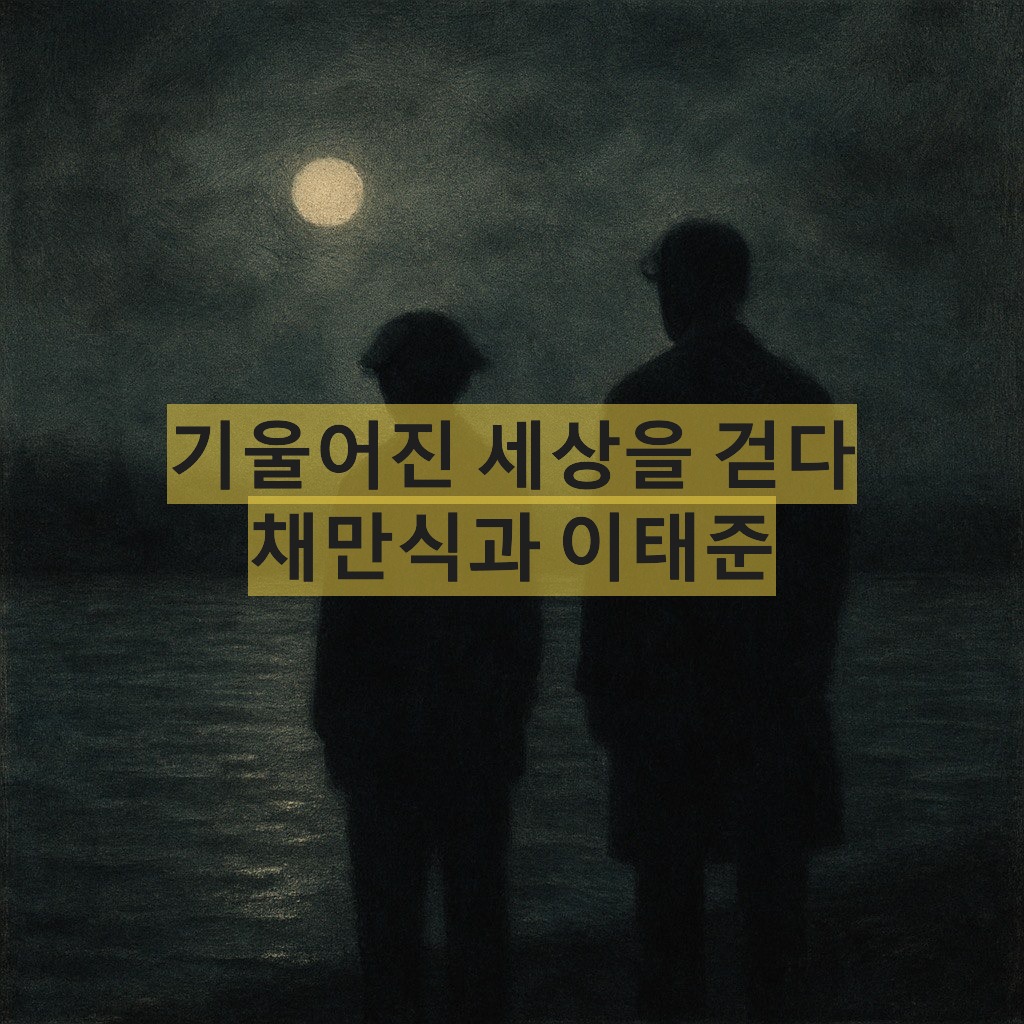
1. 기울어진 세상을 바라보는 눈
세상이 한쪽으로 기울어졌다. 발을 땅에 딛고 서 있어도 자꾸만 미끄러진다. 손으로 벽을 짚어봐도, 벽마저 흔들린다. 그게 바로 일제강점기였다. 나라를 잃고, 말도 억눌리고, 삶은 부서진 유리조각 같았다. 이때, 부서진 조각들을 자세히 들여다본 사람들이 있다. 채만식과 이태준. 그들은 가짜 희망 대신, 삐걱대는 현실을 정직하게 그렸다.
2. 냉소와 연민 사이에서, 채만식
채만식(1902-1950)은 웃으면서 칼을 드는 작가였다. 그가 그리는 세상은 헛웃음이 절로 나는 풍경이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사람들은 제자리에서 맴돌았다. 대표작 〈태평천하〉를 보면, 한 귀족 집안이 시대의 변화를 전혀 알지 못한 채 멍청하게 몰락해 가는 모습을 그린다. 웃기지만, 그 웃음 끝에는 뻐근한 고통이 남는다.
채만식은 인간이 가진 비참함을 숨기지 않았다. 그래서 그의 문장은 건조했다. 물을 쫙 짜낸 수건처럼, 축축하지 않고 퍽퍽했다. 이런 문학 경향을 ’ 리얼리즘’이라고 한다. 쉽게 말하면, 현실을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여주려는 태도다. ‘리얼리즘’은 19세기 프랑스의 귀스타브 플로베르 같은 작가들이 시작했다. 그들은 말한다. “거짓 위로 대신, 진짜 상처를 보여주자.”
채만식은 이 말을 한국 땅에 그대로 옮겼다. 비틀비틀 걷는 사람들, 이빨을 드러내고 억지로 웃는 사람들, 그들을 냉정하게 기록했다.
3. 부드러운 칼날, 이태준
이태준(1904-?)은 채만식과 조금 달랐다. 그는 칼을 숨긴 채, 부드러운 손길로 세상을 쓸어내렸다. 그러나 그 손끝엔 차가운 감각이 숨어 있었다. 대표작 〈달밤〉을 보면, 서로 다른 삶을 사는 두 남자가 달빛 아래에서 만난다. 겉으로는 평화롭지만, 그 속 말 못 할 상처와 부끄러움이 흐른다.
조용히, 그러나 끈질기게. 이태준은 인간의 내면을 섬세하게 포착했다. 사람들이 말하지 못하는 슬픔, 들키고 싶지 않은 욕망 같은 것. 이런 스타일은 ’ 심리적 리얼리즘’이라고 부른다. ‘심리적 리얼리즘’은 인간의 마음속 움직임을 깊이 있게 묘사하는 경향이다. 이런 개념은 주로 19세기 러시아의 소설가 표도르 도스토예프스키가 발전시켰다.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속은 요동치는 그런 인간을 그린 것이다.
4. 기울어진 세상을 걷다, 현실주의 문학의 두 얼굴
채만식과 이태준은 둘 다 ‘깨끗한 거울’이 아니라, ‘울퉁불퉁한 거울’을 들이밀었다. 왜곡된 세상을 곧이곧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채만식은 삐걱거리는 목재 계단처럼, 딱딱하고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다.” 이태준은 젖은 모래 위를 조심조심 걷듯, 섬세하고 서늘하게 속삭였다.
“사람들은 웃으면서도, 속으로 울고 있다.” 그 둘의 방법은 달랐지만, 결국 하고 싶은 말은 같았다. “우리가 살던 세상은 이렇게 기울어져 있었다.”〈태평천하〉를 읽다 보면, 세상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게 무너질 수 있는지 알게 된다.〈달밤〉을 읽다 보면, 조용한 밤에도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무겁게 울리는지 알게 된다.
일제강점기는 지나갔지만, 삐걱거리는 세상은 아직도 남아 있다. 채만식과 이태준이 내민 거울 속을 들여다보면, 지금 우리의 모습도 어렴풋이 비친다. 우리는 여전히 기울어진 세상 위를 걷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