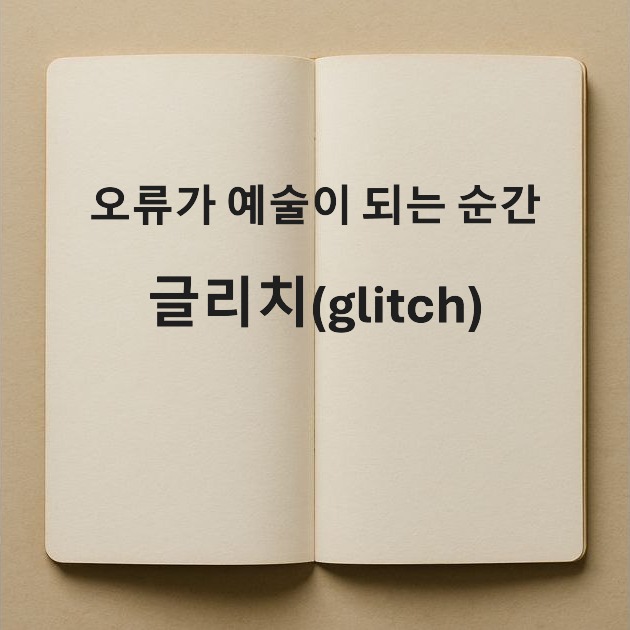
1. 글리치 (glitch)
살다 보면 하루가 이상할 때가 있다. 평소처럼 커피를 내리는데 갑자기 커피머신이 한 박자 늦게 숨을 쉰다든가,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가 늘 뛰어올라 앉던 의자를 멀찍이 바라보기만 한다든가. 아주 작은 틈새 같은 순간들 말이다. 설명할 수도 없고, 설명할 필요도 없는 빈틈 같으면서도 불길한 느낌이 드는 이상한 하루.
평범한 일상이 갑자기 뭔가 한 톱니 어긋난 듯한 기분이 든다. 기계 소리가 조금 늦고, 바람이 조금 다르며, 사람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린다. 그리고 그 순간을 묘사하는 단어가 있다. 우리가 은밀히 두려워하면서도 매혹되는 단어. 바로 글리치(glitch)이다.
2. ‘작은 고장’이 드러내는 큰 진실
글리치는 원래 기술적 용어다. 기계나 디지털 시스템에서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작은 오류, 즉, 프로그램이나 신호가 잠시 삐끗하는 현상이다. 하지만 나는 이것을 단순한 오류라고 부르고 싶지 않다. 글리치는 세계가 정상 작동하는 방식에 잠깐 생기는 틈이며, 그 틈을 통해 우리가 평소에는 보지 못하던 이면이 살짝 드러나는 순간이다.
스마트폰 화면이 갑자기 깨진 화면처럼 번쩍한다든지, 영화 스트리밍이 잠깐 멈칫하며 배우의 얼굴이 괴상하게 늘어난 순간을 떠올려보자. 그건 단순한 고장이 아니라, 마치 현실이 순간적으로 스스로의 껍질을 벗겨 보이는 장면과도 같다.
3. 대중예술 속 글리치: 이미 우리는 그것을 보아왔다
글리치를 가장 분명하게 체험할 수 있는 건 당연히 영화다. 영화 <메트릭스>에서 데자뷔처럼 고양이가 두 번 지나가는 장면. 그건 시스템이 깨졌다는 신호다. 세상이 조금 어긋났으니 정신 바짝 차리라고 말해주는 장면이다. 또는 마블 <완다비전>에서 화면이 60년대 컬러 톤에서 갑자기 80년대로 바뀌거나, 캐릭터의 말투가 불쑥 시대를 벗어나 흔들리는 순간들이 있다.
게임에서도 흔하다. <사이버펑크 2077>에서 갑자기 캐릭터가 벽을 뚫고 나타난다거나, 자동차가 허공에 뜨는 장면들. 이런 글리치들은 때론 웃기지만, 이상하게도 현실이 가진 구조적 취약성을 떠올리게 한다. 그리고 음악에서도 있다. 현대 전자음악의 많은 순간은 글리치를 일부러 사용해 만든다.
소리가 찢어지고 반복되고, 기계가 고장 난 듯한 텍스처를 만들어내는 음악. 그건 오류가 아니라 스타일이고, 정서이고, 하나의 미학이다.
4. 일상의 글리치: 기계만 고장 나는 게 아니다
기계나 화면에서만 글리치가 생기는 건 아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현실적 글리치’를 경험한다. 아침에 나와 보니 어제 주차했던 자리에 차가 없는데, 1초 뒤에 바로 옆에 멀쩡히 서 있다든가 하는 경우다. 순간적으로 공간에 대한 인지 자체가 비틀렸던 것이다. 지하철에서 헤드폰을 끼고 있는데, 음악이 꺼졌는데도 귓속에 여전히 멜로디가 울리는 순간도 있다.
친구가 분명 방금 전까지 밝게 얘기하고 있었는데, 순식간에 표정이 바뀌고 당신만 그 이유를 모르는 순간도 있다. 이처럼 글리치는 세계가 잠깐 비트에서 벗어나는 현상이다. 우리가 늘 일정한 박자로 두드린다고 믿었던 메트로놈이 사실은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던 것과 같다.
글리치가 무서운 이유는 단순하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세계의 안정성’을 건드리기 때문이다. 우리는 세상이 일정하게 돌아간다고 믿고 싶다. 버튼을 누르면 불이 켜지고, 창문을 열면 바람이 들어오며, 사람이 웃으면 행복하다고 느끼는 세계. 그 세계는 우리가 안전하다고 느끼기 위해 필수적이다.
그런데 글리치는 그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에 틈을 만든다. 그 틈은 아주 작지만, 상징적으로는 엄청난 무게를 지닌다. 그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된다. 이 세계가 내가 생각한 만큼 견고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5. 글리치 미학: 오류가 예술이 되는 순간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다. 글리치는 공포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현대 예술에서는 오히려 주목받는 미학이다. 왜냐하면 글리치는 세계의 ‘완벽함’을 깨뜨리고, 그 깨뜨린 틈에서 새로운 아름다움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예술가들은 오래전부터 결함, 파손, 오류에서 미학적 가치를 발견해 왔다. 글리치 아트는 그래서 생겨났다.
사진이 디지털적으로 깨진 화면, 색이 뭉개지고 삐져나온 픽셀, 잘못 재생된 영상의 얼룩, 오디오가 튀며 생긴 기묘한 잡음 등 이 모든 것들이 오히려 ‘새로운 모습’을 드러낸다. 단순한 흠이 아니라, 가능성이다. 마치 글리치가 세계의 깊이를 밝혀주는 조명처럼 작동하는 것이다. 예술은 늘 ‘고장 난 지점’에서 새로운 언어를 찾는다.
그러니까 글리치는 이 고장 난 곳에서 발명되는 새로운 감각의 증명이다.
6. 글리치는 우리 삶의 은유다: 완벽함은 없다
살아보면 안다. 사람도 글리치가 있다. 감정에도 글리치가 있다. 기억에도 글리치가 있다. 우리는 완벽하게 작동하는 존재가 아니다. 때로는 이유 없이 불안해지고, 이미 지나간 일의 기억이 삐뚤게 다시 떠오르기도 하고, 사람에 대한 감정이 하루 사이에 뒤집히기도 한다.
이런 순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자아의 안정성’에 금을 낸다. 그러나 그 금이 우리를 인간답게 만든다. 글리치는 결국 삶의 불완전성을 들여다보게 하는 창문이다. 우리는 그 창문을 보며 두려워하지만, 동시에 거기서 새로운 세계를 본다. 그리고 글리치를 경험한 우리는 예전과 똑같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작은 틈새가 알려준 것이 있기 때문이다. 세계는 늘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수많은 변수와 불안정한 조각들이 겨우 조율된 상태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조금 더 조심히, 조금 더 섬세하게 세계를 바라보게 된다.
글리치는 우리에게 완벽하지 않은 세계의 숨결을 보여준다. 그 작은 틈 속에서 우리는 두려움과 아름다움, 불안과 창조, 고장과 가능성의 모든 결을 동시에 듣게 된다. 세계가 흔들리는 그 순간, 우리는 진짜 세계의 모습을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