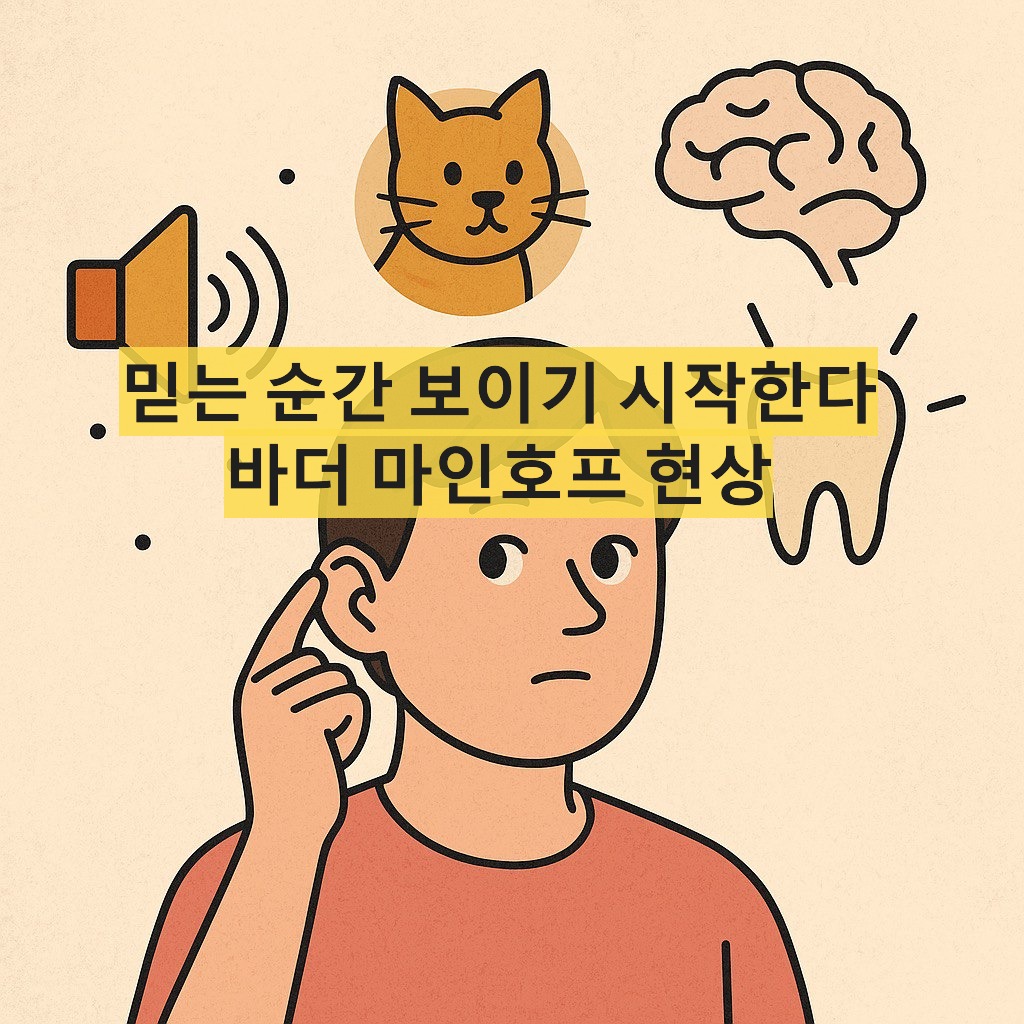
1. 바더 마인호프 현상
버스를 기다리며 라디오를 듣고 있었고, 그 라디오는 “치아 미백”에 대해 떠들고 있었다. 그냥 그런 광고였다. 그런데 그날 오후, 친구가 갑자기 말했다. “나 치아 미백 받아볼까 해.” 순간 머리가 찌릿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지하철 안 광고판에도 치아 미백이 있었다. 치아 미백. 치아 미백. 치아 미백. 세상이 갑자기 그 말로 가득 찬 것처럼 느껴졌다. 이건 우연일까?
이런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바더 마인호프 현상’이라고 부른다. 어떤 정보를 처음 접한 뒤, 그게 마치 세상 모든 곳에 나타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현상이다. 마치 귀신처럼 슬그머니 다가와선, 머릿속에 눌러앉는다.
2. 바더 마인호프 현상의 유래
이 이론을 만든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학문적으로 이 개념을 ‘처음 만든 사람’은 없다. 하지만 이름의 유래는 있다. 어느 날, 한 온라인 게시판에 누군가가 “바더 마인호프라는 독일 극좌 테러 단체에 대해 처음 알았는데, 그날 이후 자꾸 그 이름이 여기저기서 보인다”고 썼다. 그 이후, 그 글이 퍼졌고, 그 현상은 ‘바더 마인호프 현상’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름만큼은 우연이 만든 것이다.
물론 이 현상에는 학문적 이름도 있다. ‘빈도 착각(또는 빈도 편향)’이라는 것. 우리가 어떤 정보를 의식한 이후, 그 정보가 더 자주 등장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현상이다. 심리학자 토머스 길로비치(Thomas Gilovich)가 이와 비슷한 현상을 연구했는데, 그는 사람들이 세상을 ‘기억의 렌즈’로 본다고 말했다. 쉽게 말하면, 뇌가 선택적으로 보고 듣는다는 뜻이다.
3. 뇌도 선택한다
우리의 뇌는 모든 정보를 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랬다간 미쳐버릴지도 모른다. 그래서 뇌는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만 걸러서 기억하고, 나머지는 슬쩍 지운다. 그런데 어떤 단어, 어떤 이미지가 ‘중요한 정보’로 분류되면, 그 순간부터는 그걸 찾아내는 안테나가 세워진다.
한 번 ‘고양이’라는 단어에 꽂히면, 길거리 벽화 속 고양이, 인스타그램 속 고양이, 친구의 티셔츠에 새겨진 고양이까지 다 눈에 띈다. 고양이는 전에도 있었지만, 우리는 그제야 본다. 바더 마인호프 현상은 그런 식으로 나타난다. 고양이처럼 조용히 다가와선, 도처에 흔적을 남긴다.
4. 근사한 착각
이 현상은 종종 사랑에도 나타난다. 누군가를 좋아하게 된 순간, 그 사람이 말한 단어나, 입은 색깔, 좋아하는 노래가 자꾸 우리 주변을 맴돈다. 아니, 그렇게 ‘느껴진다.’ 우리가 깨어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랑은 원래 그런 것이다. 세상이 그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마치 세상이 우리 마음을 눈치채고 일부러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것이 바로 바더 마인호프의 장난이다. 물론 신호는 없다. 신호는 없지만, 우리는 그것을 신호처럼 읽는다. 그것이 인간이다.
바더 마인호프 현상은 착각이지만, 그 착각은 인간의 기억과 관심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우리는 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는 대로 본다. 그러니 다음에 누군가 “오늘따라 이상하게 그 단어가 자꾸 보이네”라고 말하면, 고개를 끄덕여주자.
세상은 바뀐 게 없다. 다만, 당신이 깨어난 것이다.
그리고 그 깨어남이 당신을 더 섬세하게, 더 주의 깊게 만든다면 그건 꽤 괜찮은 착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