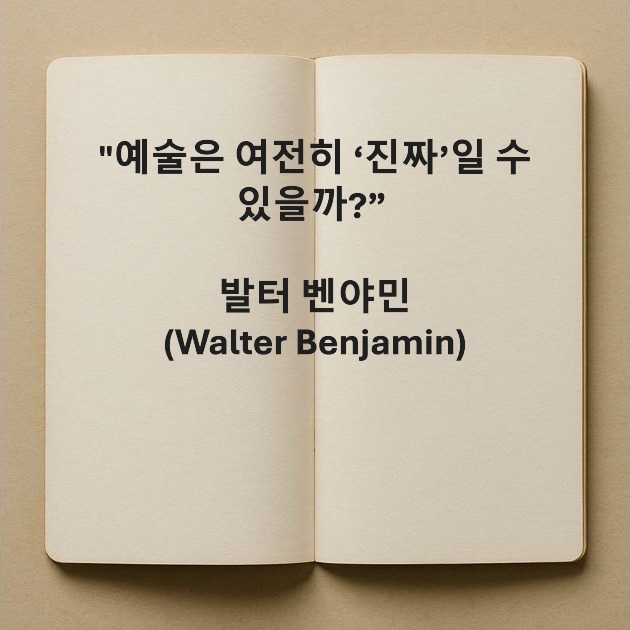
1. 기술복제 시대의 예술작품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의 『기술복제 시대의 예술작품(The Work of Art in the Age of Mechanical Reproduction)』은 20세기 예술 이론의 핵심 고전 중 하나이다. 이 글은 1936년에 쓰였고, 사진과 영화 같은 기계 기술로 복제된 예술이 기존 예술의 본질과 사회적 역할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설명한다.
“사진, 영화 같은 기술로 복제된 예술은 전통적인 그림이나 조각, 회화와 어떻게 다를까?” 혹은 “복제가 쉬워진 시대에 예술은 여전히 ‘진짜’ 일 수 있을까?” 같은 질문에서 출발한 생각이었을 거라고 짐작한다.
2. 아우라(Aura)의 붕괴
벤야민이 말하는 가장 유명한 개념이 바로 “아우라”이다. 전통 예술작품은 오직 하나뿐인 원본이고, 특정 시간과 장소에 존재한다. 예를 들어, 박물관에 있는 모나리자 같은 이 고유함이 바로 ‘아우라’인 것이다. 즉, “오직 거기에서만 느낄 수 있는 독특한 분위기”, 그 작품만의 고요한 숨결, 먼지 낀 역사 같은 것이다.
그런데 사진이나 영화는 복제가 너무 쉽다. 수백 장, 수천 장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벤야민은 말했다. “기술 복제는 아우라를 파괴한다.” “복제가 가능해지면, 예술은 더 이상 유일하지 않다.”라고 말이다. 하지만, 벤야민은 사진과 영화를 단순한 ‘짝퉁’ 예술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예술 형태로 봤다.
예술이 더 이상 *신성한 공간(교회나 박물관)*에만 머무르지 않고, 대중의 일상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이다. 영화관에서 수천 명이 동시에 예술을 소비하는 건, 예전엔 상상도 못 했던 일이었고, 벤야민은 이를 혁명적인 전환으로 봤다.
3. 예술의 정치화, 정치의 예술화
기술 복제 시대의 예술은 이제 ‘정치적 메시지’를 담는 수단이 되기도 했다. 예전 예술이 왕과 신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다면, 이제 예술은 노동자, 대중, 민중을 위해 봉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래서 벤야민은 예술은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켜야지, 파시즘처럼 정치적 권력이 예술을 장식처럼 이용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4. 마치며
기술 복제 시대의 예술은 포스트모더니즘에서 원본과 복제의 구분이 무너지는 이론들과 연결되기도 하고, 현대 디지털 아트, NFT, 유튜브 영상도 이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예전엔 누군가 그림을 한 점 사야만 감상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고흐의 전시회를 찍어 올릴 수 있고, 예전엔 영화 한 편 보려면 극장에 가야 했지만, 지금은 넷플릭스에서 언제든 영화 한 편 감상이 가능하다.
벤야민은 바로 이런 변화를 1930년대에 이미 예견한 사람이다. “기술은 예술의 종말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예술을 여는 문이다.”라고 했다. 복제된 예술이 흔하디 흔한 오늘날, 오히려 우리는 다시 물어야 하는지도 모른다. “진짜 예술이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