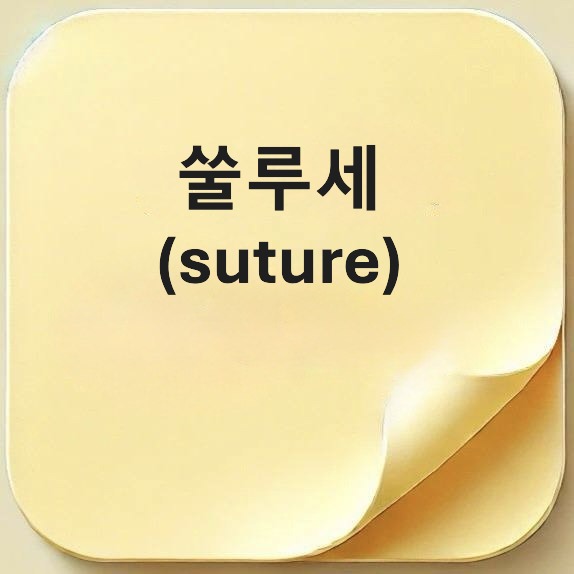
1. 쑬루세 (suture)
쑬루세는 프랑스어다. 의미는 단순하다. 꿰매기, 봉합하기. 상처를 실로 꿰매는 그 행위다. 이 단어가 영화이론으로 들어왔을 때, 뜻은 조금 달라졌지만 중심은 그대로다. 쑬루세란, 영화가 관객을 화면 속 세계에 ‘꿰매 넣는’ 방식이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이렇다. 영화는 계속 말한다.
“이건 그냥 화면이 아니야. 이 안에서 보고, 느끼고, 판단해.” 우리는 그 제안에 거의 저항하지 않는다. 쑬루세는 강요가 아니라 습관처럼 작동하기 때문이다.
2. 처음에는 언제나 구멍이 있다
모든 영화는 처음에 구멍으로 시작한다. 화면이 켜지는 순간, 우리는 묻는다. 이 장면을 누가 보고 있는 걸까? 이 카메라는 어디에 서 있는 걸까? 왜 이걸 지금 보여줄까? 이 질문들은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존재한다. 곧 사라진다. 왜냐하면 영화는 곧바로 그 구멍을 꿰매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런 장면을 떠올려보자. 한 여자가 창밖을 본다. 카메라는 그녀의 얼굴을 비춘다. 다음 컷에서 창밖 풍경이 나온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해한다. “아, 저 풍경은 그녀가 보고 있는 거구나.” 하지만 사실 이건 엄밀히 말하면 착각이다. 그 장면을 보고 있는 건 카메라이고, 실제로는 아무도 보고 있지 않다.
그런데 우리는 질문을 멈춘다. 그리고 영화 안으로 들어간다. 이때 작동한 것이 바로 쑬루세다.
3. 일상으로 풀어보는 쑬루세
쑬루세를 이해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일상에서 떠올리는 것이다.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할 때를 생각해 보자. 상대가 말하다가 잠시 멈추면, 우리는 그 침묵을 채운다. 표정, 억양, 이전의 말들을 엮어서 “아, 이런 뜻이겠구나” 하고 이해한다. 사실 상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이미 해석을 끝낸다. 그 틈을 우리가 스스로 꿰맨 것이다.
영화도 똑같다. 카메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 의도도 설명하지 않는다. 그 대신 빈자리를 남긴다. 쑬루세는 그 빈자리를 관객이 스스로 메우도록 만드는 구조다. 그래서 관객은 능동적인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은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길을 걷고 있다.
4. 대중영화 속 쑬루세의 순간들
봉준호의 영화 <기생충>에는 계단이 자주 나온다.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카메라는 늘 누군가의 뒤를 따른다. 우리는 그 인물의 시선을 빌려 공간을 인식한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인물의 위치가 곧 우리의 위치가 된다. 이때 우리는 질문하지 않는다. 왜 이 계단인가, 왜 이 시점인가. 이미 영화에 봉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조커〉는 쑬루세를 일부러 불안하게 만든다. 주인공이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인지 망상인지 알 수 없게 만든다. 관객은 계속 꿰매졌다가, 다시 풀린다. 그래서 이 영화는 편안하지 않다. 쑬루세가 완벽하게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영화 안에 들어가 있지만, 동시에 계속 밀려난다.
쑬루세는 보이지 않을수록 성공한다. 실밥이 보이면, 상처가 떠오른다. 영화도 마찬가지다. 카메라의 존재를 느끼는 순간, 편집의 의도를 의식하는 순간, 우리는 다시 관객석으로 돌아온다. 그래서 고전적 할리우드 영화들은 쑬루세에 매우 충실했다. 자연스러운 쇼트-리버스 쇼트와 시선을 이어주는 편집, 관객이 길을 잃지 않도록 배치된 카메라
이 모든 것은 관객을 화면 속 세계에 묶어두기 위한 장치다. 쑬루세는 기술이 아니라 태도에 가깝다.
5. 마치며
쑬루세는 일종의 합의다. 영화와 관객 사이의 조용한 약속. “당신은 이것이 허구라는 걸 알지만, 잠시 잊어도 괜찮아.” 우리는 그 제안을 받아들인다. 현실보다 덜 안전하고, 덜 명확한 세계로 기꺼이 들어간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만 가능한 감정들이 있기 때문이다. 공포, 연민, 사랑, 후회. 그 감정들은 항상 누군가의 시선을 빌려서 온다.
영화가 끝나고 불이 켜지면, 우리는 다시 돌아온다. 의자가 느껴지고, 다리가 저리고, 현실이 시작된다. 그때야 비로소 깨닫는다. 아, 내가 한동안 다른 세계에 다녀왔구나. 쑬루세는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다만, 감정만 남긴다. 그리고 그 감정은 꽤 오래간다. 나는 가끔 영화보다, 그 영화가 나를 어떻게 꿰매 넣었는지를 더 오래 생각한다.
어디에서 들어갔고, 어디에서 완전히 잊고 있었는지. 아마도 우리는 모두, 보이지 않는 실밥으로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지도 모른다. 그 실밥이 느슨해질 때, 우리는 예술을 찾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