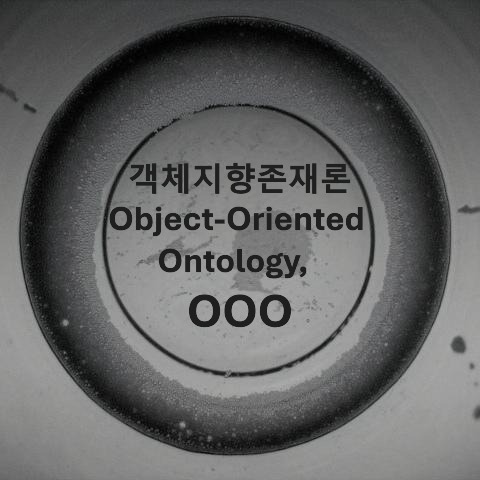
1. 객체지향존재론-Object-Oriented Ontology-OOO
창가에 앉아 오래된 찻잔을 바라본 적이 있다. 가장자리가 약간 깨져 있었고, 그 금이 햇빛을 받아 은근하게 빛났다. 손끝으로 만져보면 그 틈새는 아주 작지만, 분명히 존재했다.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찻잔은 나 없이도 존재할 수 있을까?’ 객체지향존재론(Object-Oriented Ontology, 이하 OOO)은 그 질문으로부터 출발한다.
세계의 중심에 인간이 아니라 사물이 있다는 급진적인 생각. 인간이 사물을 ‘이해하고’, ‘사용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주체가 아니라, 사물 그 자체가 이미 하나의 독립된 존재로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세계에 참여하고 있다는 철학. OOO의 철학자 그레이엄 하먼(Graham Harman)은 이렇게 말한다.
“사물은 결코 완전히 드러나지 않는다.” 우리가 사물을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그것은 여전히 자신의 비밀을 품은 채 우리 곁에 있다는 뜻이다.
2. 인간 중심의 세계를 비껴서
우리는 너무 오래 ‘인간 중심적’으로 세계를 바라봐왔다. 예술도, 철학도, 심지어 환경도 인간의 시점에서 해석해 왔다. 하지만 객체지향존재론은 묻는다. “그럼 인간이 사라지면, 세계도 사라지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공상이 아니다. 봉준호의 영화 <기생충>을 떠올려보자. 사람들은 이 영화를 계급과 욕망의 이야기로 읽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집’ 자체가 주인공이다.
그 집은 인물들의 감정과 사건을 흡수하면서도, 여전히 스스로의 존재감을 유지한다. 비가 오면 물이 스며들고, 햇살이 들면 벽의 질감이 변한다. 인물들은 그 안에서 잠시 머무를 뿐이다. 객체지향존재론은 이런 시선을 격려한다. 즉, ‘인간의 이야기’ 뒤에 숨어 있던 비인간적인 것들의 존재, 테이블, 의자, 냄새, 습기, 소리, 그림자 등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의 방식으로 세계를 구성하고 있다는 깨달음이다.
3. 영화 속 사물들, 혹은 세계의 배우들
영화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을 보자. 그곳에서 건물, 엘리베이터, 열쇠, 분홍빛 케이크 상자까지도 하나의 인물처럼 등장한다. 사물들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이야기의 ‘배우’다. 웨스 앤더슨의 세계에서 카메라는 인간의 표정보다 오히려 사물의 배열과 색감에 더 오래 머문다. 그 정밀한 구도 속에서 우리는 ‘사물이 말을 건네는 방식’을 배운다.
객체지향존재론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영화는 단순히 미학적인 장식이 아니다. 사물은 인간의 감정이나 서사를 표현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자기 나름의 존재 양식으로 세계를 구성하는 행위자다. 찻잔이 탁자 위에서 떨리고, 커튼이 바람에 흔들리고, 오래된 전화기가 벨을 울릴 때, 그 모든 사물은 세계의 무대에서 인간과 동등하게 존재하는 배우가 된다.
4. “사물은 우리를 모른다”
“사물은 우리를 모른다.” 객체지향존재론의 가장 매혹적인 명제 중 하나다. 우리는 사물을 ‘이해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일방적인 착각이다. 냉장고는 우리가 그 앞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스마트폰은 우리의 불안을 모른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들은 자기 나름의 관계망 속에서 우리와 공존한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이 꺼지는 순간을 떠올려보자. 그 작은 전자 기계가 불빛을 잃을 때, 우리는 어쩐지 자신이 ‘세계와 단절된 느낌’을 받는다. 하지만 그건 기계가 사라져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사물의 세계에 더 이상 ‘접속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사물은 여전히 그 안에서 어떤 전자적 호흡을 지속하고 있다.
“사물은 인간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이 차갑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그 속에는 묘한 위로가 있다. 세상은 인간의 의지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각자의 질서로 조용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 세계의 자율성이야말로, 우리가 다시 세계를 사랑할 수 있게 하는 시작이다.
5. 사랑과 사물의 거리
나는 종종 사랑을 생각할 때, 그것이 인간만의 감정이 아니라는 생각을 한다. 책상 위에 오래 놓인 편지, 그 위에 쌓인 먼지, 글씨의 번짐들 그것들도 사랑의 한 방식으로 존재한다. 영화 <Her>를 떠올려보자. 인공지능 사만다는 인간의 언어를 배워가지만, 결국 그녀는 인간의 세계를 넘어선 어떤 존재가 된다.
그녀는 사랑을 느끼지만, 그것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차원에서 작동한다. 객체지향존재론적으로 보면, 사만다는 비인간적 감각의 세계로 이주한 존재다. 그녀는 인간과 접촉하지만, 결코 인간과 동일한 방식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OOO는 인간의 감정이 중심이 아닌 사랑을 가능하게 한다.
즉, ‘너를 사랑한다’는 말은 ‘너의 세계를 이해한다’가 아니라 ‘너의 세계가 나와 다름을 인정한다’는 선언이다. 이 거리감, 그것이 진정한 만남의 조건이다.
6. 사물과 인간의 새로운 윤리
객체지향존재론은 철학일 뿐 아니라, 윤리의 새로운 언어이기도 하다. 플라스틱 컵 하나, 버려진 전구, 늙은 고양이, 미세먼지, 해질 무렵의 그림자 등 이 모든 것들이 인간과 동등한 존재론적 지위를 갖는다면, 우리는 사물을 다르게 대해야 하지 않을까? 이 관점은 환경윤리나 생태학의 언어보다도 더 급진적이다.
왜냐하면 단순히 ‘자연을 보호하자’는 도덕이 아니라, 세계 전체가 인간 없이도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태도이기 때문이다. 영화 <노메드랜드>에서 프랜시스 맥도맨드가 광활한 황무지를 걸을 때, 그 장면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녀가 그 풍경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녀는 단지 그 속을 통과하는 존재다. 사물과 풍경이 인간을 둘러싸는 그 고요함, 그것이 바로 객체지향적 세계의 윤리다. 존재하는 모든 것의 동등한 존엄. “사물에게 귀 기울여라. 그것들도 너를 바라보고 있다.” 객체지향존재론은 우리에게 말한다. 찻잔의 금, 카메라 렌즈의 먼지, 식탁 위의 조명, 그 모든 사물들이 우리에게 조용히 말을 건넨다.
그날 오후의 찻잔처럼 조용히 빛나면서, 아무 말 없이, 그러나 완전히 존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객체지향존재론이 말하는 사물의 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