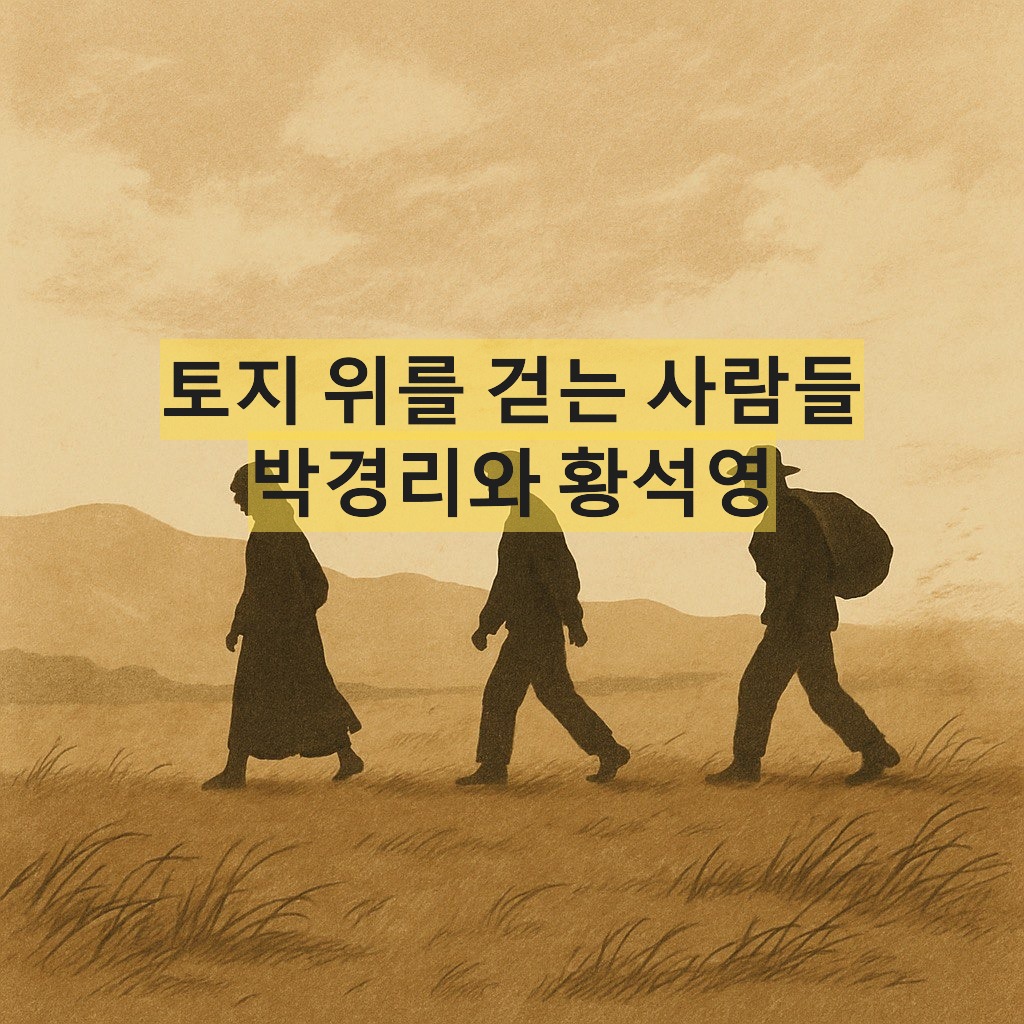
1. 흙먼지를 일으키며 걸어간 사람들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왔다. 가만히 쌓여 있던 흙먼지가 훨훨 날렸다. 문득 생각했다. 한국 문학 속 인간의 모습도 저런 게 아닐까 하고. 살아가려 버둥거리다가, 어느 순간 바람에 휩쓸려 흩어지는 존재들. 그 흙먼지를 껴안은 사람들이 있다. 박경리와 황석영. 두 작가는, 한국 현대사라는 거대한 바람 속에서 사람들의 삶을 집요하게 끌어안았다.
2. 뿌리 깊은 나무, 박경리
박경리(1926-2008)는 한국 문학의 굳건한 나무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쉽게 꺾이지 않는. 그녀의 대표작 〈토지〉는 무려 26년에 걸쳐 완성됐다. 1897년부터 1945년까지, 한국이 격변을 겪던 시대를 배경으로 삼고, 수십 명의 인물들이 등장한다. 사람들이 서로 얽히고설키며, 희망과 좌절을 반복하는 모습을 담아냈다.
박경리는 인간이 절망 속에서도 어떻게 버텨내는지를 끈질기게 그렸다. 그녀에게 인간은 꺾이지 않는 존재였다. 바람에 쓸려도, 뿌리까지 뽑히진 않는다. 이걸 문학에서는 ’ 휴머니즘’이라고 부른다. 쉽게 말하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믿는 생각이다. ‘휴머니즘’이라는 개념은 아주 오래전, 르네상스 시대의 이탈리아 학자 피코 델라 미란돌라 같은 이들이 세상에 퍼뜨렸다.
박경리의 문장은 강물처럼 흘렀다. 넓고, 깊고, 때론 무섭게 출렁였다. 한줄기 푸른 물줄기 같기도 하고, 어디론가 끝없이 흘러가는 검은 강 같기도 했다.
3. 바람 속을 걷는, 황석영
황석영(1943-)은 조금 다르다. 그는 아예 바람 속으로 뛰어들었다. 전쟁터에도 갔고, 감옥에도 갔고, 망명도 했다. 대표작 〈장길산〉은 도망자 이야기다. 조선 후기 농민 봉기 속에서 살아남으려 발버둥 치는 민초들의 삶을 그렸다. 〈삼포 가는 길〉에서는 고단한 인생을 짊어지고 떠도는 노동자들의 쓸쓸한 뒷모습을 그렸다.
황석영에게 인간은 강한 동시에 약한 존재였다. 길을 잃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돌아갈 곳을 잃어버리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늘 인간이 어딘가로 ‘걸어간다’는 사실을 포기하지 않았다. 비틀비틀, 어기적어기적, 그러다 툭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
황석영의 문학은 ‘리얼리즘’ 계열에 속한다.
‘리얼리즘’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려는 문학 경향이다. 19세기 프랑스 소설가 귀스타브 플로베르 같은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발전시켰다. 황석영의 문장은 거칠고 생생하다. 길바닥의 돌멩이를 쥐고, 손바닥을 피가 나게 문질러서라도 세상의 온도를 느끼게 하려는 글이다.
4. 끝나지 않는 이야기
박경리와 황석영은 서로 다른 길을 걸었다. 그러나 둘 다 인간을 버리지 않았다. 박경리는 땅을 파고 깊이 내려갔고, 황석영은 땅 위를 구르며 먼지와 피를 뒤집어썼다. 박경리는 ‘언젠가는 뿌리가 꽃을 피울 것’이라 믿었고, 황석영은 ‘비틀거리더라도 사람은 걷는다’고 말했다.
둘 다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았다. 둘 다 인간을 쉬운 말로 포장하지 않았다. 그들의 소설을 읽다 보면, 땀 냄새가 나고, 피비린내가 나고, 때로는 겨울밤 언 손을 비비는 소리가 들린다. 꺼지지 않는 삶의 소리가.
〈토지〉는 여전히 사람들이 읽는다.〈삼포 가는 길〉은 여전히 외로운 여행자들의 마음을 울린다. 세상은 달라졌지만, 사람들이 겪는 고통과 희망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박경리와 황석영이 던진 질문 —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 그 질문은 지금도 우리 마음 한구석에 흙먼지처럼 앉아 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조용히 일어나 우리를 흔든다.